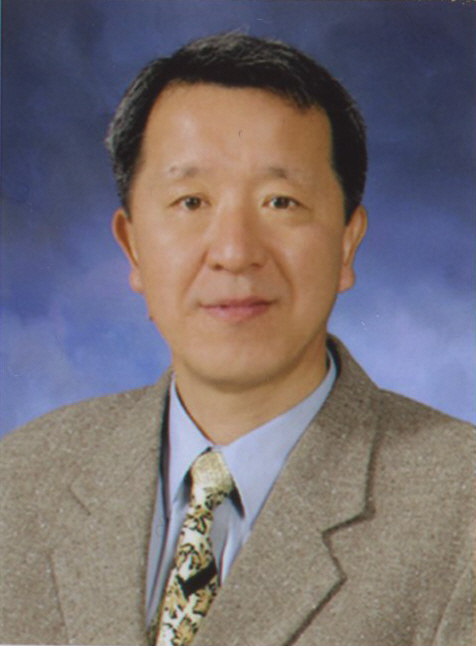
[한국농어촌방송/경남=정용우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객원교수(전 학부장)] 우리 집에는 내가 주로 거주하고 있는 본채 외에 사랑방처럼 활용했던 방이 하나 더 있다. 예전에는 손님이 많이 와서 이들을 묵게 할 요량으로 만든 별채였다. 그 후 아들이 대학 다닐 때 이 방을 사용하였기에 우리 부부는 이 방을 아들방이라고 부른다. 아들도 결혼 후 따로 보금자리를 찾았고 지금은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여름철이 성큼 다가와 이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대자리를 가지러 갔다. 그런데 그곳에 큰 벌 한 마리가 죽어 있었다. 가끔 일어나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허투루 보지 않았다. 내가 이번 장마기간 동안 감상한 한 편의 영화 때문이다. 그 영화는 ‘마담 보바리’였다. 물론 소설은 몇 차례 읽어 본 적이 있지만, 이 소설을 영상화한 것을 보는 것도 쏠쏠한 재미가 있기에 나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날에는 독서보다는 이런 영화를 즐긴다.
‘마담 보바리’. 평범한 일상에 환멸을 느끼고 공상에 사로잡혀 허영과 불륜으로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는 한 여인의 비극적 종말을 다룬 영화이다. 허영과 불륜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저 그 생활에 취해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 모르는 채 자꾸만 중독되어 가는 삶을 살다가 결국 젊은 나이에 죽음으로 이 끝없는 탐욕은 종말을 고하게 된다. 이 영화를 보면서 지나친 욕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독인가를 새삼 깨닫게 된다.
아들방에서 죽어 있는 그 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그냥 다른 벌들처럼 자연 속에서 물과 자양분을 섭취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주어진 생활에 만족하면서 살았더라면 저렇게 비참한 최후를 마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연수명을 마음껏 누렸을 텐데… 참 별난 놈이었던가 보다. 방충망을 뚫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무슨 좋은 것, 맛 나는 게 있을지 모른다고 여겼을 것이고, 그리고 그 좋은 것, 맛 나는 것을 자기가 독차지 하고 싶은 욕심에 이끌려 각고의 노력 끝에 방충망 뚫기에 성공했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 방충망을 뚫고 방 안으로 진입하였을 때는 자신이 대단한 존재, 특별한 존재라는 우월감도 물론 함께 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죽음뿐이다. 방 안에 그 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이나 자양분이 없으니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마담 보바리와 같이 죽음으로 이 끝없는 탐욕은 종말을 고하게 된다. 소중한 한 생을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마감한 셈이다.
하기야 ‘죽음의 반대는 욕망’(테네시 윌리엄즈 희극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 나중에 영화로도 제작됨)이라는 말도 있으니, 욕망이 있다는 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적당하게 관리된 욕망은 우리의 삶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것이 지나쳤을 때 문제가 된다.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몸과 마음이 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 잘못하면 감옥에까지 들락거리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이 하루를 멀다 하고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면 탐욕을 스스로 다스려 나간다는 것이 지난(至難)한 일임에 틀림없다.
뿌리와 꽃은 한 몸이지만 뿌리가 먼저요 꽃이 나중이다. 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또 이리저리 가볍게 흔들리지만 뿌리는 고요하며 흔들림이 없다. 그런데도 우리 보통 사람들은 가지에 핀 꽃이나 열매와 같은 영화(榮華)만 보려하지 나무의 뿌리와 같은 근원을 보려 하지 않는다. 욕심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보지 않으면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 긴 세월 동안 땅 속 어둠을 더듬어야 하는 뿌리가 보이지 않는 법이다. 미혹(迷惑)을 벗어나지 못한 채 어리석음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같은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신을 다잡아 나가야 한다. 살면서 향락과 재산, 지위와 명예 등을 추구할 때도 지나침은 없는지 살피면서 자신을 단속해나가야 한다. 더 나아가 큰 욕망 없이, 현재 가진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아는 지혜를 얻어낼 수 있다면 더욱 좋다.
언젠가 아내랑 문경새재를 걷다가 신라의 왕족인 궁예의 마지막 독백을 새겨놓은 표지판을 본 적이 있다. 신라가 망할 무렵, 궁예가 국경을 벗어나 쫓기면서 한 말인 듯 했다. 표지판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다.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었어. 인생이 찰나와 같은 줄 알면서도 왜 그리 욕심을 부렸을꼬? 허허허! 이렇게 덧없이 가는 것을…”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 번 되새겨 주는 하루였다. 아들방에 죽어 있는 벌에게 그리고 소설 속의 주인공 마담 보바리 부인에게 애도와 감사를 보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