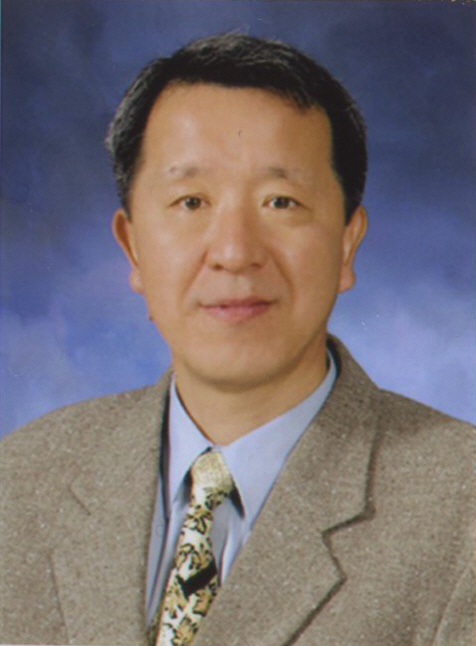
[한국농어촌방송/경남=정용우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전 학부장] 이틀 연속 가을비가 내리더니 하늘이 맑아지자마자 기온이 뚝 떨어졌다. 쌀쌀함이 느껴진다. 하여 저녁 산책 시간을 낮 시간대로 바꾸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산책길에 나선다. 날씨가 갑작스레 추워지니 코와 눈의 감각도 더 예민해지는 것 같다. 이름 모를 풀벌레들의 울음소리는 더 크게 다가오고 벼가 익어가고 있는 논배미마다 노란빛의 선명함이 더 황홀하게 다가온다. 얼굴에 내리쬐는 햇볕에 자연스럽게 고개를 젖혔더니 부쩍 높아진 청명한 하늘도 실컷 구경할 수 있다. 눈빛마저 시원해진다.
강둑길 반환점에 와서 잠시 멈춰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다본다. 여름 신역이 고됐던가. ‘할 만큼 했다는 듯’ 강물도 느슨해지고 있다. 하긴 폭우며 덩달아 휩쓸려오는 뿌리 뽑힌 것들 받아 나르느라 강들은 또 얼마나 용을 썼을 것인가. 반대편을 돌아보니 조금씩 느슨해진 물살처럼 수고로운 들판의 도처에도 가을의 청량한 기운이 돈다. 계절의 순환을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산책이라도 하고 있으면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소소한 데 있음을 새삼 눈뜨게 된다.
산책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서 새롭게 변한 사실 하나 발견한다. 제씨 집 대문 앞이 말끔하게 치워져 있다. 며칠 전까지는 감나무에서 떨어진 낙엽들이 마구 뒹굴고 있어 아주 지저분했었는데 오늘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다. 비로 낙엽을 쓸어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 보기 좋다. 낙엽만 쓸어낸 것이 아니고 감도 따냈다. 잘 익은 감 몇 개는 남겨둔 채로... 옆집 윤씨네도 마찬가지다. 지난해에는 윤 씨네 밭 주변에 심어져 있는 감나무에서 아무도 감을 따 가지 않아 그냥 풀밭에 떨어진 홍시를 내가 몇 개 주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그것이 불가능해졌다. 지난해에는 폐전으로 남아있었는데 올해는 그 밭을 경작할 사람이 나타나서 들깨를 밭 가득 심어놨더니 아마 이분이 감을 따낸 모양이다. 이분 역시 감을 따내면서 몇 개는 남겨두었다. 감나무에는 잎이 없고 오직 빨간 감만 매달려 있다. 잎이 없는 탓에 이 빨간 감은 유독 도드라져 보인다. 시골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까치밥’이다. 감나무에 매달린 채 곱게 익어가는 감. 햇살 듬뿍 받아 잘 익은 감은 이쁘기도 하지만, 맛도 아주 좋다. 새들이 즐겨 찾는 별미 중의 별미다. 이 까치밥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
장편소설 ‘대지’로 1933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 벅, 그녀의 한국사랑은 유명했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 ‘살아 있는 갈대’에서 ‘한국은 고상한 민족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다’라고 극찬했다. 그녀의 애정은 1960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했던 경험 때문이다. 한국 방문 시 동행했던 이규태 기자는 어느 날 그녀에게 질문을 받았다. 가을 시골집 마당의 감나무에 매달린 감을 보면서 한 질문이었다. “저 감은 따기 힘들어서 그냥 두는 건가요?” 이 기자는 까치밥이라 해서 겨울새들을 위해 남겨둔 것이라고 설명했고, 그녀는 그 말에 감동하며 말했다고 한다. “바로 그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보고자 한 것은 고적이나 왕릉이 아니었어요. 이것만으로도 나는 한국에 잘 왔다고 생각해요.” 까치밥으로 한국인들의 심성을 알아본 그녀다.
나무 위에 달려있는 까치밥은 겨울을 지내야 하는 새들을 위해 남겨둔 우리들의 마음이었다.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다. 인간과 동물이 공평하게 풍요를 나누는 일이 감나무 한 그루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니… 더불어 살아가는 작은 생명 하나도 배려하고 나누고자 하는 따뜻한 심성을 가진 조상들의 모습이 거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심성을 가지 우리 조상들의 후예인 우리는 어떠한가.
배려는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핵심 가치 중의 하나다. 배려는 따뜻한 마음으로 인간과 동물을 존중하는 행위이다. 자신이 아닌 다른 생명체를 도와주거나 보살피는 마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상대가 어떻게 느낄지, 어떤 생각을 할지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보다 많은 것을 가지려고 장벽을 쌓고 문턱을 높이는 이기적인 사회에서 장막을 열고 환영하며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 외면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다. 바쁜 일상 속에서 앞만 바라보던 눈길을 멈추고 잠시 주변을 돌아보면, 작은 배려나마 실천해야 할 대상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조상들의 아름다운 미덕 ‘까치밥’, 그 가르침을 되새겨 볼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