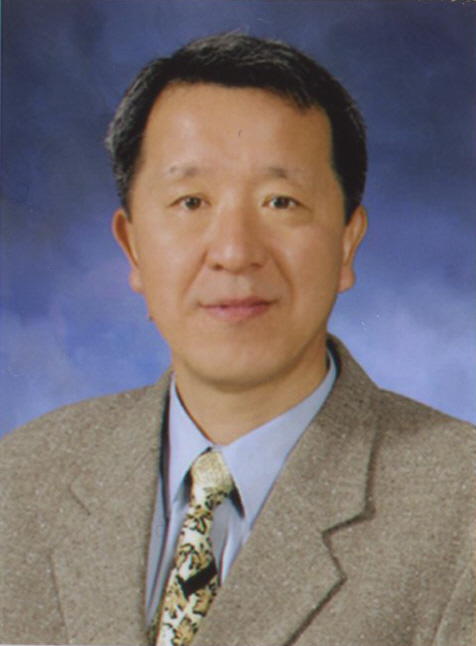
[한국농어촌방송/경남=정용우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전 학부장] 며칠에 걸쳐 우리 집 잔디밭 둘레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 가지를 쳐내는 작업을 했다. 심은 지 20년이 넘다 보니 나뭇가지들이 너무 자라난 탓에 잎이 무성할 때면 그 위세가 숲을 이룬 듯 대단해서 정원수로서 격이 심히 훼손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아내가 나뭇가지를 조금 잘라내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톱을 새로 사다 주었다. 전에 사용하던 톱은 작고 오래된 탓에 작업능률이 오르지 않아 자꾸 미루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 새 톱을 확보했으니 작업에 돌입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작업을 시작했는데 막상 부딪혀 보니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내 건강상태로는 제법 며칠 동안 작업을 해야 될 상황이다. 우선 잎이 모두 떨어진 나무부터 가지를 잘라나갔다. 조경 전문가는 아니지만 잎이 떨어져 나간 상태라야 나무의 골격을 가늠하고 나름 예쁜 모양새를 만들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맨 마지막 작업 대상은 단풍나무와 화살나무였다. 입동(立冬)이 지난 시점이라 해도 이들 나뭇잎은 빨갛게 물든 채 여전히 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여 가지를 잘라내기가 망설여져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다행히(?) 가을비가 여름비 같이 내렸다. 잔디밭에 물이 고일 정도로. 그것도 세찬 바람을 동반한 채. 하여 이 비바람에 단풍나무와 화살나무도 빨간 잎들을 땅에 쏟아부었다. 그 전까지 나뭇가지에 매달려 최고조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던 단풍잎은 이번에 내린 강한 빗줄기로 인해 대부분 낙엽 신세로 전락했다. 그 덕분에 아쉬움 없이 이들 나뭇가지도 잘라낼 수 있었다.
나는 20년 전에 이들 나무를 우리 집 정원에 심었다. 이웃동네에 사는 초등학교 친구가 ‘봄꽃 같이 아름다운 단풍’을 강조하면서 자기 집 묘목장에서 자라고 있는 이 나무들을 공짜로 나에게 준 것이다. 그때 한창 정원에 심을 나무들을 구하고 있을 때인지라 망설임 없이 옮겨 심었던 것이다. 그 후 오랜 기간 동안 가을이 되면 어김없이 빨간 단풍잎의 아름다움을 나에게 선사해 주었다.
나는 이처럼 매년 단풍잎의 고운 빛깔을 즐겨왔으나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생존을 위한 변화일 뿐, 나무는 겨울에 유지할 필요 없는 잎을 떨구기 위해 먼저 잎을 향한 물의 공급을 끊는다. 나뭇잎 세포는 죽고, 그 안에 담긴 푸른빛 엽록소도 사멸한다. 드디어 엽록소에 가려 빛 못 보던 다른 생체 분자들의 다채로운 빛의 향연이 시작된다. 엽록소에 의해 드러나지 않던 색소(안토시안 등)가 생성되기 때문이다. 이 색소에 의해 단풍나무와 화살나무 잎은 붉은색으로 변한다. 단풍잎의 고운 색깔은 어쩌면 삶을 마감하는 순간에 그 삶이 품은 면모를 발휘하는 것이겠다.
이때쯤이면 나무들은 빨갛게 물든 자신의 몸의 일부를 가차 없이 내버린다. 제 몸에 꼭 붙들고 있던 잎을 미련 없이 버리지 않고서는 매서운 겨울을 이겨낼 수도 없고 종(種) 자체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나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잎사귀 또한 마찬가지. 지금은 미련 없이 땅에 떨어져 흙으로 사라지지만 아낌없이 썩어 내년에 새롭게 피어날 잎을 위한 희생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버림과 떠남은 상실의 체념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향한 소망의 여행이다. 그래서 떨어져 나가 소멸해가지만 아름답다. 우리도 단풍잎처럼 아름답게 소멸하라고, 그래서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 마음을 붉게 물들이는 것일지 모를 일이다.
나뭇가지를 자르던 나는 빨갛게 물든 단풍 잎사귀 몇 개를 주워서 요리조리 돌려본다. 나이가 들어서 그럴까. 단풍잎을 내 노년에 비유하면 생각이 더 풍성해진다. 이제 내 인생도 가을을 지나 겨울의 문턱에 온 것이겠다 싶으니 더욱 그러하다. 이제까지 아름다운 선물로서만 나에게 다가왔던 단풍잎은 자신을 내던지면서 자연과 우주의 깊은 뜻을 새롭게 가르쳐주려는 듯하다. 이런저런 상념이 오고 간다. 이제 성대한 시절이 다 지나갔으니 그 기운을 죽여 침잠의 시간 속으로 돌아가라고 잎을 저렇게 지상 위로 떨구는 것일까.
많이 가져 더 지켜야 하는 삶보다 적게 가져 지킬 필요도 없는 삶이 더 현명한 삶은 아닐까. 비우고 버려야 새롭게 채울 수 있다면, 가진 것보다 비울 것을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은 아닐까. 권력도 돈도 명성도 때가 되면 버릴 줄 알아야 자기 것이 되고 자신도 살 수 있지 않을까. 마냥 움켜쥐려고 발버둥 치며 염치도 잃은 채 추하게 늙어가는 모습을 주변에서 자주 목도하면서 이제껏 내가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갈 삶의 모습과 여운이 늦가을 단풍잎처럼 예쁘게 보일 수 있을 지 나 자신에게 살며시 질문해 본다.

